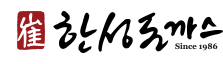[뉴스]중앙일보 선정 ‘맛대맛 라이벌’ 돈가스 부분 1위

1. 28년 동안 생등심만 고집해왔다. 2. 손님이 큰 덩어리를 잘라 먹지 않고 주방에서 썰어 나온다. 3,4. 한성돈까스 외관과 내부 모습. 처음 장사를 시작할 때 모습을 그대로다.
1위 잠원동 한성돈까스
대표메뉴: 돈까스(8500원), 비후까스(1만5000원)
개점: 1986년
특징: 지하철 신사역 근처 유명한 아귀찜 골목에 처음 생긴 돈가스 집. 28년이 흐르는 동안 주변 주택가가 높은 건물로 바뀌었지만 한성돈까스는 2층 양옥집 그대로다. 예나 지금이나 두툼한 고기도 여전하다.
주소: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97길 8(잠원동 21-5)
전화번호: 02-540-7054
좌석수: 108석(본관·별관 포함)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0시, 별관은 오후 1시30분까지만 운영. (설·추석 3일씩 휴무)
주차: 가능(7대)
지하철 3호선 신사역 주변은 독특한 디자인의 고층건물이 많다. 그런데 4번 출구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이런 주변 분위기와 전혀 다른, 옛 2층 양옥집 형태를 고스란히 간직한 한 돈가스 식당이 있다. 올해로 28년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간판으로 장사하는 한성돈까스다.
“여긴 원래 아귀찜 골목이에요. 1980년대에 아귀찜 가게가 많았죠. 지금 우리집 자리도 아귀찜 식당이었는데 장사가 엄청 잘됐어요. 이 건물을 백부가 인수하면서 제가 아귀찜 장사를 해보겠다고 나선 거죠.”
최철호(64) 사장이 36세이던 86년 일이다. 그는 77년부터 청파동 숙대 기숙사 앞쪽에서 기사식당을 운영하다 당시는 3~4년 쉬던 차였다. 그런데 막상 장사를 시작하려고 보니 그 자리에서 장사하던 아귀찜집 주인이 불과 50m 거리에 다시 아귀찜 식당을 낸 거다.
“바로 앞에서 장사를 시작하니 미안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메뉴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명동에서 잘나가는 돈가스집 하던 지인 얘기를 듣고는 그걸 팔아보자고 마음먹은 거죠. 전에 기사식당 할 때도 돈가스를 팔았거든요.”
그는 당시 친척이 일본에 있어서 자주 오가기도 했다. 최 사장은 고기가 두툼한 일본식 돈가스가 한국에서도 먹힐 거라 예상하고 일본에서 현지식 돈가스 만드는 법을 2개월 동안 다시 배웠다. 처음엔 자신감이 넘쳤지만 식당 문 열고 1년 동안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루에 돈가스 여덟 장밖에 못 판 적도 있어요. 가격이 2500원이었는데 좀 비싸다고들 생각했나 봐요. 그래도 그냥 버텼어요.”
한성돈까스에 자주 오던 한 은행지점장 말에서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맛은 있는데 직장인이 먹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최 사장은 4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90년대 들어 물가가 계속 올랐거든요. 1~2년 지나니 오히려 우리집 돈가스가 상대적으로 좀 싼 편이 됐어요. 그때부터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행히 가게세 안 내도 되는 상황이라 힘든 시기를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죠.”
손님이 늘고 맛 좋다고 입소문까지 나면서 이제는 거꾸로 자리가 없을 정도로 바빠졌다. 이때부터 한성돈가스는 늘 줄 서서 먹는 집이란 인식이 퍼졌다.
“처음에 돈가스 팔겠다고 했을 땐 주변 아귀집 사장들이 ‘여기서 웬 돈가스’라는 뜨악한 반응을 보였어요. 게다가 주변 상권 특성상 24시간 운영하는 집이 많은데 우리는 밤 10시면 늘 문 닫고 들어갔거든요. ‘무슨 배짱으로 저렇게 장사하냐’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런데 우리집이 잘 되니까 그때부터 주변에 돈가스집이 막 생기더라고요.”
단순히 경쟁가게가 여럿 생긴 것만이 아니다. 시기와 질투에 시달린 적도 많다. 최 사장은 “한번은 우리 손님이 주변에 새로 생긴 돈가스집 갔다가 벽에 ‘한성돈까스 음식은 음식도 아니다’라는 식의 언론 보도내용이 붙어있어 기분 나빴다는 말을 전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처음엔 그런저런 일을 겪을 때마다 상처를 크게 받았지만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않는다. 결국 맛있고 경쟁력 있는 집이 살아남는다는 걸 경험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런 소신 때문에 지금도 가게에서 팔리는 모든 음식은 직접 만든다. 냉장 등심을 가져와 직접 다지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뒤 빵가루를 입혀 튀긴다. 소스도 직접 개발한 방법으로 만들고 깍두기 반찬도 가게에서 담근다.
최 사장은 “우리집 돈가스가 특별한 게 없는 데도 손님들이 많이 좋아해 주고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맛이 똑같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건물 외양부터 맛까지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지만 요즘 변한 게 하나 있다. 손님 기분에 따라 음식 먹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성돈까스는 밀려드는 손님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2008년 본관이 있는 가게 뒤 건물 2층에 별관을 만들었다. 깔끔한 분위기를 원하는 젊은 여성 손님은 주로 새로 지은 별관을 선호하고 옛 분위기를 좋아하는 오랜 단골은 본관에서 먹는다.
“본관은 이제 30년이 다 돼 가잖아요. 좀 고치고 싶어도 ‘맛도 모습도 옛날 그대로’라고 좋아하는 손님들이 있어서 선뜻 공사도 못해요.”
최 사장은 처음 1년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고비가 없었다고 한다. 문 닫는 식당이 부지기수였던 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에는 오히려 손님이 늘었다. 가격을 3~4년 주기로 500원씩 올려 왔는데, 외환위기 즈음엔 5000원 정도였다. 다른 집에 비해 가격이 싸다고 느낀 손님이 더 많이 찾은 거다. 최 사장은 지금이 돈가스 장사 시작한 이래 가장 힘들다고 말한다. 돼지고기 값이 엄청 뛰었기 때문이다.
“전엔 1kg에 2000원 정도 했다면 지금은 7000원이에요. 특히 지난해보다 올해 두 배 가까이 뛰었죠. 모르긴 몰라도 올해 문 닫는 돈가스집 많을 거예요.”
그래도 최 사장은 든든하다. 아들 기석(33)씨가 5년 전부터 대를 이어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장사가 잘되니까 오래 전부터 분점 내자는 연락이 많이 왔어요. 그래도 절대 안 해요. 처음 장사 시작할 때부터 3대, 4대째 대를 잇는 일본식당처럼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결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찌감치 절대 남에겐 안 주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다행히 아들이 하겠다고 나섰으니 좋죠.”
기석씨는 식당일을 경험해보더니 한성돈까스를 오래 이어가기 위해선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난해 법인회사를 설립, 레시피를 메뉴얼화하고 ‘한성’에 성씨인 ‘최’를 넣어 상표권 등록도 마쳤다. 또 젊은 사람답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방송 등에서 요즘 유명하다고 소개되는 집을 찾아가 맛보는 것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새로 생긴 집이거나 ‘한성돈까스보다 맛있다’라는 글이 올라오는 곳은 꼭 찾아가요. 아마 서울에 있는 웬만한 돈가스집은 다 갔을 걸요. 맛을 따라 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인기있는 집은 반드시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장점을 배우러 가는 거죠. 대를 이어 아버지가 키워온 가게를 잘 운영하려면 이 정도 노력은 해야죠.”
출처 : 중앙일보
링크 : 기사 원문 보기